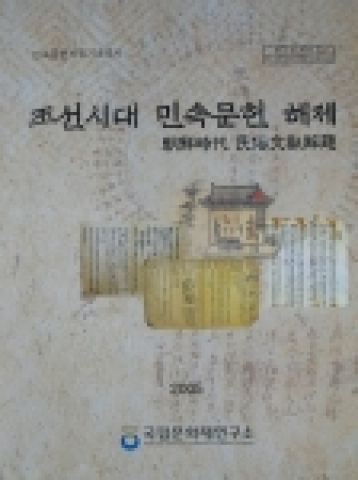최초의 민속문헌 해제 ‘조선시대 민속문헌해제’ 발간
『조선시대 민속문헌 해제』에는 『경도잡지(京都雜誌)』 등 민속관련 문헌 304종의 해제가 농림수산·의식주·세시·예서·민간신앙 등 17항목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으며, 임란이후 민간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진 『과화존신(過化存神)』, 태교 풍습과 관행을 살필 수 있는 『태교신기(胎敎新記)』, 요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 책으로는 가장 오랜 자료인 『수운잡방(需雲雜方)』, 역병의 퇴치 및 예방을 위해 행한 여제(厲祭)의 기록물인 『여제등록(厲祭謄錄)』 등의 사례가 있어 민속 각 분야에 대한 성격과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해제집은 이해준(공주대 교수),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소장), 주강현(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전재경(법제연구원 실장) 등 민속학계의 각 부문별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간 민속학계에서 요구되었던 “쓰여진 기록자료”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점검, 활용을 위한 공동연구를 했다는 점에서도 발간 가치가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조선시대에 이어 2006년에 구한말·일제강점기 민속문헌 해제를 추진, 민속관련 문헌 집대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헌자료 사례>
1. 『조선시대 민속문헌 해제』
1) 過化存神(384쪽)
1880년 고종의 명으로 關聖敎의 경전을 모아 언해한 책. 실제 편찬자나 언해자는 미상이다. 이 책은 이후 같은 내용으로, 또는 약간의 수정 편집을 거쳐 민간에서 많이 간행되었다.
민속관련으로는 이 책이 중국의 관성교 신앙과 충효 및 절의의 권장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만, 그 상당 부분은 임란 이후 조선의 민간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문과 영험담, 경전의 간행 發願과 寫經 공덕 등은 민간신앙뿐 아니라 불교와의 교섭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세진경은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도교 계통 신종교 교단의 주요 경전으로 신봉되고 있다.
2) 胎敎新記(174쪽)
태교신기는 師朱堂 李氏(1739~1821)가 1800년(정조 24)에 임신한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문으로 글을 짓고 아들인 유희가 音義와 언해를 붙여 1801년에 완성한 태교서이다.
사주당 이씨는 자신의 태교경험과 풍부한 학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태교가 다른 나라의 태교와 다른 점은 임신 전 태교와 부성태교를 강조한 것인데, 이 책에는 이러한 점들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태교신기는 手稿本 1책으로 원문 26장, 언해 43장 등 합하여 69장이다. 유희의 1801년 발문이 있고, 책의 첫머리에는 ‘胎敎新記章句大全’이라고 적혀 있고, 본문은 한문과 언해로 되어 있다. 이 책은 2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는 태교의 이치, 태교의 효험, 태교의 중요성, 태교의 방법, 옛사람들의 태교 방법 등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태교는 남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인에게 가르쳐주도록 권하고 있다. 또한 태내의 가르침 외에도 임신부의 마음가짐,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 임신부의 생활태도 등에 관한 내용들이 각 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태교신기는 일찍이 태교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조선시대 태교 풍습과 관행에 대하여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민속학적으로 구전 채집되는 현장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시대 태교의 전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 需雲雜方(106쪽)
光山金氏 禮安派에서 전해진 전통요리책으로 조선 전·중기 安東을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식생활 문화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이다. 특히 요리에 관한 내용만을 다룬 책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가장 오랜 자료라 하겠다.
『需雲雜方』는 총 121항목의 조리 및 가공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酒類가 절반인 61항목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김치[沈菜]류 17항목, 醬類 9항목, 酢類 6항목, 播種 5항목, 造菓 3항목, 채소 저장[藏菜] 2항목, 魚食醢 1항목, 기타 조리법 17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항목마다 서술 내용이 재료의 사용에서 조리, 가공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에는 술 종류가 59개나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 16세기 전반 안동 및 인근 지역에서 담그고 마셨던 술의 종류 및 문화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전래된 외래주의 종류도 알 수 있으며, 燒酒 항목의 경우 이른바 ‘안동소주’의 유래를 밝힐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4) 厲祭謄錄(351쪽)
조선시대 역병의 퇴치 또는 예방을 위하여 행한 致祭인 厲祭와 관련된 정부 기록물이다. 1637년(인조 15)부터 1727년(영조 3)까지의 내용이 실려 있다. 여제는 조선 정부의 중앙과 지방에서 행한 역병 대책 가운데 가장 정례적이고, 일반적이며, 1차적이었다. 서울에서는 북악산에 여단이 있었으며, 지방의 각 군현에서도 조선 초부터 성황단, 사직단과 함께 여단을 3단 중 하나로 반드시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이 제사는 예방의 차원에서 봄철에는 청명에, 가을철에는 7월 보름, 겨울철에는 10월 초하루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다. 또한 역병이 유행했을 때에는 병의 퇴치를 위해 따로 날을 잡아 수시로 여제를 지냈고, 병이 다급할 때에는 날짜를 따지지 않고 제사를 지냈다.
조선사회에서는 역병이 고혼이 흩어지지 않고, 지상을 떠돌다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한 고혼으로 대표적인 것은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의 넋이었다. 이밖에도 칼에 맞아 죽은 자, 수화나 도적을 만나 죽은 자, 남에게 재물을 빼앗기고 핍박받아 죽은 자, 남에게 처첩을 강탈당하고 죽은 자, 형화를 만나서 억울하게 죽은 자, 천재나 역질을 만나 죽은 자, 맹수와 독충에 해를 당해 죽은 자, 얼고 굶주려 죽은 자, 위급하여 스스로 목매어 죽은 자, 담이 무너져 압사한 자, 난산으로 죽은 자, 벼락 맞아 죽은 자, 추락하여 죽은 자, 죽은 뒤 자식이 없는 자 등의 넋이 대상이 되었다. 성황신은 이런 모든 원혼을 모으는 것으로 중시되었다.
이 책은 17-18세기 조선 사회의 연도별 또는 각 지방별로 역질이 유행하였던 역사적 사실과 함께 여제에 관한 동기, 行祭의 풍습, 역질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홍보담당관실 042-481-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