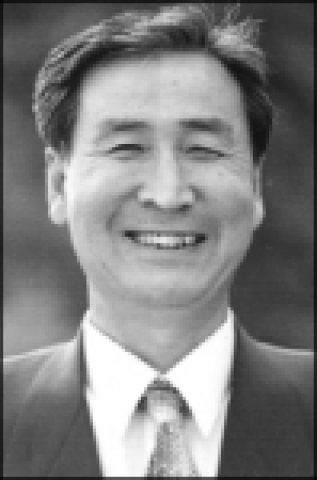경상대학교 신경득교수, ‘庶子 콤플렉스’ 논문 인터넷 블로그에 연재 ‘관심’
국립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신경득(辛卿得·62·국어국문학과) 교수는 3월 2일부터 인터넷 블로그 ‘아침나라 논단’(kr.blog.yahoo.com/achimnara4415)에 ‘출생의 비밀, 그루갈이 삶을 위한 씨뿌리기’라는 제목의 논문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신경득 교수의 블로그 논문 연재는 두 가지 점에서 관련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대학교수가 논문을 학회나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펴내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연재함으로써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끊임없이 독자·학자들과 ‘소통’하겠다는 발상이 새로운 논문쓰기의 한 방법으로서 이채롭기 때문이다.
둘째, 신경득 교수의 논문은 건국신화와 서사무가, ‘모밀꽃 필 무렵’ 등 우리나라 신화와 문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서자 콤플렉스를 파헤친 민족 서사시와 같은 대형논문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를 서자, 얼자, 간자라고 하는데 신경득 교수는 이를 ‘얼받이’라고 부른다. 환인의 아들 환웅과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경득 교수는 논문의 발문에서 “남의 씨를 잉태한 채 시집을 가거나 이미 출생한 아이를 데리고 개가하는 경우 홍명희와 신채호는 이들을 ‘덤받이’라고 부른다”며 “자신도 ‘덤받이’였던 동명왕은 소서노와 결혼하나 그녀는 이미 부여 왕족 우태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를 두었는데 이들이 덤받이의 예이며 규중 처녀와 지렁이 사이에 태어난 견훤도 그러하다”고 말한다. 또한, ‘모밀꽃 필 무렵’의 주인공 ‘동이’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
신경득 교수가 논문 제목에 사용하고 있는 ‘그루갈이 삶’이란 ‘때를 놓치거나 가뭄이나 홍수 때문에 문전옥답이 아닌 산야나 박토에 오곡 대신 구황작물로 멋대로 뿌려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가리킨다. 얼받이나 덤받이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신경득 교수는 논문 머리말에서 “하나의 화소에 몇 개의 중핵 화소를 통합하고 새로운 통로를 열어놓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서 “출생의 비밀이라는 화소에 건국신화·서사무가·입말이야기·이효석 소설이 갖는 중핵화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드라마 쪽으로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경득 교수는 “한국문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심층심리에 자리잡고 있는 그루갈이 삶의 양식을 찾아 이효석의 소설 ‘모밀꽃 필 무렵’으로 끌고가 하나의 핵심 단락으로 통합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하늘의 천신이 지신이나 수신에게 감응한다→천신은 떠나고 지신이나 수신은 홀로 아기를 분만한다→동아리로부터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는다→어머니를 졸라 출생의 비밀을 알아낸다→그루갈이 삶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아버지를 만나 나라를 세우거나 신책을 맡는다’는 구조다.
신경득 교수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얼받이와 덤받이도 나라를 세우고 생명의 여신이 되고 별이 됐다는 것, ‘모밀꽃 필 무렵’의 동이도 ‘섬이 무던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는데 누가 그들에게 침을 뱉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신경득 교수는 “논문을 블로그에 연재하는 것은 연구실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내리는 게 아니라 일반독자나 관심분야가 같은 학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논문쓰기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득 교수는 건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4년부터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며, ‘소백산맥 아래서’(시집), ‘낮은 데를 채우고야 흐르는 물은’(시집), ‘한민족사상론’(평론집), ‘조선 종군실화로 본 민간인 학살’(평론), ‘사람 살리고 가난 구하는 역성혁명’(평론) 등의 책을 펴냈다.
또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소설이 입선했으며, 1978년 월간문학으로 평론활동을 시작했으며, 1997년 남명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웹사이트: http://www.gsnu.ac.kr
연락처
경상대학교 홍보실 055-751-6082, 010-7753-9887, 이메일 보내기
신경득 교수 055-75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