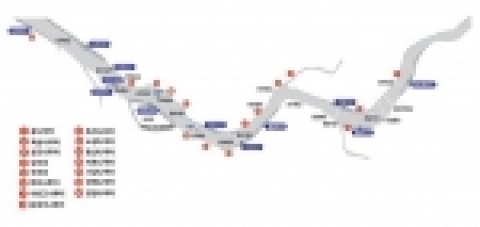“한강변 나루터 역사를 알면 다리가 다시 보인다”
지금은 한강종합개발과 교량건설로 자취를 감추고, 나루터였음을 알리는 작은 표석만이 한강의 긴 역사의 숨결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근대식토목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루는 한강 양안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과 운송, 상권형성 그리고 초소 구실도 함께 하여 범죄인이나 불순분자를 기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광나루는 지금의 광진교와 천호대교가 자리잡고 있어 조선시대 서울 에서 중랑천을 건너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넌후 강원도와 남쪽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곳이다.
명종때 지금의 천호동 부근에서 약수가 샘솟아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면서 성내 사대부 부녀자들의 가마가 나루터에 붐볐다고 한다.
뚝섬나루는 지금의 영동대교가 지나가는 뚝섬 선착장 부근에 있었던 나루터 로서 일명 독백(禿白)이라 하였으며, 조선 효종 때 한강을 이용해서 목재· 땔감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곳에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수세소 (收稅所)를 설치하여 운영되었다. 남쪽 강안(江岸)에는 불교 33대 사찰의 하나인 봉은사가 있어 도성의 부녀자들이 불공을 드리기 위해 주로 이용했던 나루이다.
삼전도나루 또는 삼밭나루라 불리던 이곳은 지금의 잠실대교가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세종이 한강 건너 대모산 기슭에 있는 아버지 태종의 헌릉을 참배하러 가는 길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여주에 있는 영릉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선릉을 참배하기 위해 임금이 종종 건너던 나루이다. 중종 31년(1536)에는 배를 이어서 배다리(舟橋)를 가설하기도 하였던 곳이다.
두모포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동호대교로서 지금의 성동구 옥수동에 있었던 한강나루의 보조나루로서 일명 두뭇개, 동호(東湖)라고도 하였다. 일화에 의하면 조선 명종 때 두모포에 사는 어부가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를 나룻가에서 잡았는데, 그 크기가 나룻배만 하였다. 바다 물고기가 멀리 강줄기를 찾아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를 보고 당시 사람들은 권세를 부리던 윤원형(尹元衡)의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또한 두 모포나루까지는 수량이 풍부했음을 말해준다.
입석포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성수대교로서 성동구 응봉동 강변에 있었던 포구로 주위의 경치가 좋아서 예로부터 낚시터로 이용되었던 곳이다. 예전에는 포구 바로 앞에 저자도(楮子島)라는 섬이 있어서 닥나무가 산출되었으며 주로 유람객들이 많이 오고 갔다. 뒤에는 응봉이 높이 솟아 있고 강변에는 기암이 우뚝하며 강 건너 압구정의 경치도 좋아 예로부터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들었다.
한강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한남대교로서 조선시대 제1의 도선장(渡船場) 으로 옛날에는 ‘한강도(漢江渡)’라고 하였으며, 신라 때는 ‘북독(北瀆)’이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사평도(沙平渡)’ 또는 ‘사리진(沙里津)’이라고 하여 중요한 나루터로 지목되었으며, 서울에서 용산·충주로 통하는 큰 길의 요충지였다. 예전에는 서울의 남산 남쪽기슭인 지금의 한남동 앞의 강을 한강이라 하였고, 이곳의 나루를 한강도라 하였다.
서빙고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반포대교로서 용산구 서빙고동의 도선장 (渡船場)이다. 본래 두모포(豆毛浦)에 있었던 동빙고와 더불어 얼음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빙고에 저장된 얼음은 궁중에서 주로 종묘(宗廟) · 사직(社稷)의 제사에 이용되었다. 이곳에 남한강의 세곡선이 기착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후기에 한강나루 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서빙고 나루로 이설하고자 한때도 있었다. 강 건너 동작진과 마주한다.
동재기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동작대교로서 조선시대 서울에서 과천· 수원·평택을 거쳐 호남으로 내려가거나 서울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넜던 교통의 요지였다. 이곳은 인근 노량진 관할하에 있었는데, 호남·호서 지방의 과객과 사대부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나 사선 몇 척만이 운용되어 교통이 불편하였다. 수심이 깊고 물길이 험해 “조선 왕조실록”에는 동작진에서 나루를 건너다가 배가 침몰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기록이 많다.
흑석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한강대교로서 동작구 흑석동 강변에 있었던 나루이다. 도성에서 수원이나 과천 방향으로 왕래하려면 노량진이나 한강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통행량이 많고 기찰이 심하여 민간인들은 사선(私船)으로 운행되는 이 곳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참이 폐지되고 또한 인근에 동작진이 개설 되면서 기능을 잃어갔다. 광복 이후 한때 이 곳은 조정경기 훈련장으로 되어 몇 척의 카누가 멋지게 물살을 가르고 오가기도 하였다.
노량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한강철교로서 노량진에서부터 양화진까지는 버드나무가 많았으며, 특히 노량진에는 백로들이 많이 날아와 ‘노들’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 길목은 시흥·수원은 물론 충청도·전라도로 통하는 대로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지금은 큰 다리가 놓이고 노량나루가 있던 지점에는 노량진 수원지가 자리잡고 있어 옛 정취를 찾아볼 수 없다.
용산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원효대교로서 용산구 원효로와 대건로(大建路)가 만나는 지점으로서 한강을 건네 주는 나루라기보다는 조운선(漕運船)이 집결하는 선착장이었다. 일찍이 고려시대에는 한강의 본류가 지금의 여의도 샛강 쪽으로 치우쳐 흘렀고 북안에는 따로이 한 물줄기가 흘러 들어 포구 밑에서 하나의 호수를 이루어 경승지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마포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마포대교로서 도성 서쪽 10리 지점에 있었던 나루로 일명 삼개나루라 불렀다. 오늘날 마포대교 북쪽 방면으로 반대쪽의 여의도는 예전에 백사장이었다. 백사장을 지나면 시흥을 거쳐 수원으로 가는 길이 된다. 도선장에는 주로 상선들이 운집하였으며, 나룻배도 사선 (私船)이 중심이었다. 옛부터 마포나루에는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 “마포새우젓장사”라는 애칭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서강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서강대교로서 곡물의 집산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미 고려 충렬왕은 관리들의 녹봉을 맡아보는 광흥창을 이곳에 설치했다. 이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많은 관리들이 서강 주변에 모여 살았다. 이에 따라 정미소도 많았다. 또 서강지역은 와우산에서 한강과 밤섬,멀리 양화나루와 마포나루까지 바라볼 수 있어 정자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정치인과 지성인들이 이곳에서 쉬면서 국사를 논하고 결의했다고 한다.
양화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양화대교, 성산대교로서 마포구 합정동 지역의 한강 북안에 있었던 나루터로서,지금의 양화대교와 성산대교가 자리 잡고 있다. 양화도(楊花渡)라 하였으며,서울에서 양천을 지나 강화로 가는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상에 위치 하였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지역은 한강 가운데서도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정자가 많았던 곳인 반면, 개화기때 개화사상의 선각자로 널리 알려진 김옥균(金玉均)이 처형된 곳이 기도 하며 오늘날 이곳에는 양화진 순교자기념관이 절두산에 세워져 있어 그 영령들을 기리고 있다.
공암나루가 있던 이곳은 지금의 행주대교로서 강서구 개화동 한강 남쪽 지역 으로 나루 중간쯤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바위가 있어 구멍바위, 즉 공암이라 하는 나루의 이름이 유래되었으며, 강화도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했다. 강 건너에는 고양시가 보이고 광주암(廣州岩)이라고 부르는 바위섬이 물 가운데 있어 기이한 풍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웹사이트: http://hangang.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 기획과 02-3780-0763
한강시민공원사업소기획과 과장 박명진3780-0763 011-9975-7424 홍보팀장 임윤기3780-0770
이 보도자료는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