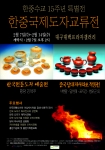박현의 ‘우리말 이야기마당’
상식적인 가정 하나! 해모수와 고주몽이 있던 지역은 몽고와 만주벌판, 그러면 고몽고어와 고만주어를 알아야 『한단고기』나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인명과 지명 등 고유명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언어만 알 수 있다면 판타지라도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텐데...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픽션의 한계도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우리가 늘 쓰는 말을 통해 우리 문화를 다시 살펴보는 이야기마당이 도서출판 바나리 주최로 열린다. 이야기마당을 여는 주인공은 고(古)언어와 인간학에 기초해 오랫동안 글쓰기를 해오고 있는 박현 소장(한국학연구소)이다.
그가 옛우리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인연이 자리했다. 어려서부터 우리말을 배운 인연은 무엇보다 독특했다. 영해 박씨 문중의 장손이기에 그만이 배울 수 있었던 『부도지』(符都誌)가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그후에 고만주어와 고몽고어 및 일본의 신대문자에서 시작해, 중국 윈난성에 있는 나시족과 바이족, 이족 등 소수민족의 언어까지... 그는 고금의 언어를 하나의 언어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처럼 많은 언어들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서로 소통될 수 있는 이론적인 기틀은 어소론과 음운변화법칙이다.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소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그가 말하는 생체론적 어소론이다.
그는 그에 기초해 동양학과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글쓰기 작업을 해오고 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비롯해 사람의 본래 의미를 풀어놓고 있는『나를 다시하는 동양학』, 우리말의 법칙과 다양한 용례들을 소개하고 있는『다시하는 이야기』, 『지유』에서는 윈난 소수민족들이 쓰고 있는 차의 개념과 『한단고기』「삼성기」편을 옛우리말로 풀어놓고 있다.
“해모수는 ‘해머슴’, 머슴이 지금은 심부름꾼으로 떨어졌지만, 본래 ‘머슴’은 ‘마숨’으로 ‘진실하고 깨끗한 이’를 가리킨다. 고주몽의 ‘고’는 ‘높은 신’ 혹은 ‘높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몽고어에서 명궁을 나타내는 ‘저머’의 음차어인 주몽은 추모나 중모 등으로 불렸다. ‘다물’은 ‘더무’이고 이 말에는 소리바꿈이 일어나고 촉음이 들어가 ‘무터’가 된다. 해모수가 말했던 ‘다물’을 우리말 코드로 풀면 고조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터를 되찾겠다는 의미이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광개토왕의 다른 이름이 담덕(談德)으로 당시에는 ‘단다’로 읽었고, ‘단다’의 의미는 ‘땅을 넓히다’이다. 광개토(廣開土)는 ‘단다’의 훈차인 셈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의 ‘임나’는 ‘미마나’로 그 말뜻은 ‘천황의 출신지’를 가리킨다.”
박현 소장은 우리말 이야기마당에서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말을 살펴보고자 한다. ‘슬기롭다’(혼이 제 자리를 잡고 있다) ‘아름답다’(알이 움을 트다) ‘멋있다’(지혜가 있다) 는 등, 우리가 늘 쓰는 말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다시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밝음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가리키고, ‘나라’가 ‘땅에 내려온 태양’이었기에 우리 나라와 아버지는 더 훌륭해지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적인 말을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피워가는 우리말 이야기마당은 6월 27일 화요일(저녁 7시)에 열린다. 그는 1년에 반은 중국에서 지내는데 한국에 있는 날이면 쉬지 않고 열 예정이다. 창덕궁 앞 국악로에 위치한 지유명차 일세정차관에서 열리고, 참가비는 없으며 참석도 제한이 없다.
현재 박현 소장은 민족의학신문에 ‘윈난(雲南) 소수민족 의학 탐방기’를, 불교신문에 ‘박현의 茶와 禪’을 연재하고 있다. (이야기마당 문의전화: 02-3673-5634)
바나리 개요
바나리는 문화기획과 도서출판을 하고 있으며, 지유명차와 함께 차문화사업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banary.co.kr
연락처
도서출판 바나리 기획편집실 서해진 주간, 02-3673-5634, 016-334-5634,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