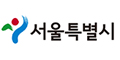‘만해 한용운 심우장’ - 서울시 8월의 문화재로 선정
한용운은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정옥(貞玉), 법명은 용운(龍雲), 호는 만해(萬海, 卍海)이다. 한용운은 1919년 승려 백용성(白龍城) 등과 불교계를 대표하여 독립선언 발기인 33인 중의 한 분으로 참가하여 3·1독립선언문의 공약 삼장을 집필하였다.
한용운은 처음 설악산 오세암에 입산하여 승려가 되었다가, 시베리아와 만주를 순력한 후 28세 때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출가하여 정식으로 승려가 되었다. 1910년에는 불교의 변혁을 주장하는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하였고, 1926년에는 근대 한국시의 기념비적 작품인 「님의 침묵」을 펴 냈으며 1927년에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를 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한용운은 3·1운동으로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성북동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지인들의 도움으로 땅을 매입한 후 1933년 조선총독부가 있는 남쪽과 마주보기 싫어 북쪽을 향한 산비탈에 심우장을 짓고 살다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심우장의 위치는 성북구 성북동 222-1호이며, 대지 374㎡에 건축면적은 52㎡이다. 대지의 동쪽으로 난 대문을 들어서면 왼편에 한옥으로 지은 심우장이 북향하여 서 있다. 대문 왼쪽에는 소나무, 오른쪽에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각각 서 있고, 그 오른쪽 모서리에는 한용운이 손수 심은 향나무 한 그루가 있다.
'심우'는 선(禪) 수행의 단계를 소와 목부(牧夫)에 비유하여 열 폭의 그림으로 그린 심우도(尋牛圖, 일명 十牛圖ㆍ牧牛圖)의 첫 번째 그림으로 소를 찾는 동자가 산 속을 헤매는 모습을 초발심의 단계에 비유한 내용이다. 한용운의 아호 중에는 '목부'가 있는데, 이는 소를 키운다는 뜻을 가졌다.
건물의 형태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역(逆)'ㄴ'자형 평면이며, 중앙에 대청 2칸을 두고, 왼쪽인 동쪽에는 서재로 쓴 '심우장' 온돌방 한 칸을 두었고, 오른쪽으로는 부엌 1칸이 있으며, 부엌에서 남쪽으로 꺾여 나간 곳에 찬마루 1칸이 있다. 대청과 온돌방은 반자틀 천장이고, 부엌과 찬마루 사이는 벽이 없이 트였으며, 삿갓천장을 하여 서까래를 노출시켰다. 대청과 부엌 북쪽으로는 창문을 단 툇마루를 놓았고, 온돌방의 북쪽에서 동쪽·남쪽을 돌아가는 대청 남쪽과 찬마루 동쪽으로는 쪽마루를 놓았으며, 온돌방 남쪽 마당에는 굴뚝이 서 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정면인 북쪽은 겹처마이고 남쪽은 홑처마로 되어 있다. 현재 심우장의 온돌방에는 한용운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 반자틀 : 천장에 널·합판 등을 붙이거나 미장바름 바탕으로 졸대를 대기 위하여 꾸미는 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문화재과장 김호연 3707-9430
서울시 공보관실 언론담당관 한문철 02-731-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