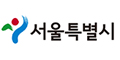은평구 진관동 석(石) 보살입상,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
- 최치원이 언급한 삼각산 화엄십찰(華嚴十刹) 청담사(靑潭寺)터에 위치한 고려전기 석 보살입상
-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일한 아미타정인 불상편도 문화재자료로 함께 지정
진관동 석 보살입상은 고려전기(10세기~11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서울지역에서 보기 드문 작품이어서 앞으로 서울지역과 중부지역 고려석불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 있는 고려시대 불교조각으로는 고려전기에 조성된 북한산 구기동 마애석가여래좌상(보물 제 215호)과 승가사 승가대사상(1024년, 보물 제 1000호) 등이 있고, 고려후기 작품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옥천암 마애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7호), 성북구 보타사 마애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89호) 등이 있다.
또한 진관동 석 보살입상 바로 옆 청담사터에서 ‘삼각산청담사삼보초(三角山靑潭寺三寶草)’라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어 신라 때 문장가(文章家) 최치원(崔致遠, 857~?)이 저술한‘법장화상전(法藏和尙傳)’에 나오는 화엄십찰(華嚴十刹) 중 하나인 ‘부아산 청담사(負兒山 靑潭寺)’일 가능성이 커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법장화상전’과 화엄십찰
‘법장화상전’은 최치원(崔致遠)이 중국 당(唐)나라 법장화상(法藏和尙)의 영적(靈的) 생애를 서술한 책으로 내용 중에 신라의 의상(義湘)이 당나라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세운 화엄사찰 10곳을 나열하고 있다. 즉 태백산 부석사(浮石寺), 원주 비마라사(毘摩羅寺), 가야산 해인사(海印寺), 비슬산 옥천사(玉泉寺), 금정산 범어사(梵魚寺), 지리산 화엄사(華嚴寺), 팔공산 미리사(美理寺), 계룡산 갑사(甲寺), 웅주 가야협 보원사(普願寺), 삼각산 청담사(靑潭寺) 10개 사찰을 말한다.
※ 부아산
삼각산의 별칭으로 부아악(負兒岳), 화산(華山)이라고도 불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제 3권 漢城府 山川條에 인수봉을 동쪽에서 바라보면 어린 아이를 업은 모양과 같다고 한 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위치한 곳은 이전부터 ‘탑골’〔塔洞〕이라 불리던 곳으로, 이 일대에 이전부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살입상 앞에 나말려초(羅末麗初)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石) 아미타불좌상과 고려시대 석탑(石塔) 부재(部材)가 전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준다.
진관사 석 보살입상은 현재 자씨각(慈氏閣)이란 전각 안에 봉안되어 있다. 건물 안에 모셔진 보살입상은 현재 높이가 158.5cm이고, 머리높이는 43.5cm로 고려 전기에 많이 나타나는 약 4등신의 신체 비례를 보인다. 발목 아랫부분은 땅에 묻혀 있다. 자씨는 산스크리트어 마이트레야(Maitreya)의 음역(音譯)으로 미륵보살을 지칭하나 자씨각이 근래에 지어진 건물이고, 도상학적으로 이 보살입상을 미륵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얼굴은 장방형으로 뺨에 살이 올라 여성적이고 온화한 인상을 준다. 이마가 좁고 이목구비가 중앙으로 몰려 있는데 이러한 얼굴표현은 나말려초에서 고려전기 불·보살상에 많이 보이는 형태이다. 이 보살입상의 특징 중 하나는 높게 솟은 보계(寶髻)이다. 높게 솟은 보계와 머리 중간에는 정면과 좌우 측면에 장식이 달린 보관을 착용하고 있다. 불상의 육계(肉髻)처럼 높은 보계를 지닌 보살상은 강원도 원주시 매지리 석조보살입상 등 주로 나말려초~고려전기에 많이 나타난다. 이마의 백호(白毫)는 후대에 황색 구슬로 만들었다.
※ 보계(寶髻) : 보살의 머리 위에 높게 솟은 상투
※ 육계(肉髻) : 부처의 머리 위에 솟은 살 또는 머리뼈로 ‘지혜’를 상징
※ 백호(白毫) : 불상이나 보살상 양쪽 눈썹 사이에 난 희고 부드러운 털
신체는 약 4등신의 단구형(短軀形)으로 전체적으로 당당하면서도 양감과 볼륨감이 넘친다. 상체에서 하체로 이어지는 굴곡이 뚜렷하고, 가슴과 둔부는 양감이 넘친다. 그러나 통일신라시대 보살상에 보이는 팽팽한 긴장감과 탄력감은 사라져 시대양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풍만한 양감과 볼륨감을 나타내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저하, 약 4등신의 신체 비례감, 균일한 간격으로 형식화된 옷주름의 표현 등 고려 전기 보살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천의(天衣)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대의(大衣)형으로 양쪽 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通肩)이다. 옷주름선은 대체로 도식적이고 균일하게 조각되었다. 깊게 파인 목선 아래로 반복적인 U자형 옷주름이 이어지다가 다리부분에서 Y자형으로 갈라져 대퇴부가 강조되면서 다시 U형을 이루는 이른바 우전왕식(優塡王式) 옷주름선이 조각되어 있다. 소매의 옷주름은 마치 지느러미처럼 뻗어 나온 형태로 연속된 세로선의 주름선으로 조각되었다.
※ 천의(天衣) : 보살이 입는 옷으로 천의는 상의(上衣)를 말하고, 하의(下衣)는 군의 (裙衣)이다.
※ 대의(大衣) : 부처가 입는 옷으로 입는 방식에 따라 크게 양쪽 어깨를 덮는 통견(通肩)과 한쪽 어깨를 드러낸 우견편단(右肩遍袒)으로 나뉜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가슴까지 들어 올려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있고, 왼손은 손목을 꺾어 옷자락을 감아쥐고 있는 형태이다.
※ 수인(手印) : 불 · 보살상이 깨달음의 내용이나 서원(誓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손 모양
서울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려전기 보살상인 진관동 석 보살입상의 가장 큰 특징은 높게 솟은 보계와 대의형 천의를 걸치고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보살상들은 주로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그런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서울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시대양식의 연구 및 중부지역 보살상 연구 등 고려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불교가 매우 융성했던 것으로 알려진 삼각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발굴 과정에서 ‘청담사’명 기와가 발견됨에 따라 최치원이 언급한 화엄십찰 중 ‘삼각산 청담사’일 가능성이 높아 당시 불교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진관동 석 보살입상 앞에는 나말려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좌상편(阿彌陀佛坐像片)과 고려시대 석조(石造) 부재가 놓여 있다. 불좌상은 아미타불만이 지을 수 있는 아미타정인(阿彌陀定印)을 짓고 있어 아미타불이라는 존명(尊名)을 확인할 수 있다. 아미타정인은 금강정경계(金剛頂經系) 의궤(儀軌)에 나오는 밀교계 도상(圖像)으로 신라하대에 전래되어 나말려초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고려후기에 다시 나타난다.
※ 도상(圖像) : 종교나 신화적 주제를 표현한 미술작품에 나타난 인물 또는 형상
현전하는 예로는 경상북도 풍기 비로사 석조아미타불좌상과 경주 분황사 석조아미타불좌상 등의 극소수의 예만 존재한다. 진관동 석 아마타불좌상은 상반신이 파손되었지만 현재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전하는 유일한 아미타정인의 불상으로 자료적 가치가 크다.
석조 부재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석탑이나 불상대좌 등으로 추정되는데, 앙련(仰蓮)과 복련(伏蓮), 안상(眼象)과 귀꽃이 조각되어 있다.
※ 귀꽃 : 석등이나 돌탑 따위의 귀마루 끝에 새긴 꽃 모양의 장식
서울시는 진관동 석 보살입상이 서울지역에서 보기 드문 고려 전기 보살상이고, 주변에서 ‘청담사’명 기와가 출토되어 최치원의‘법장화상전’에 나오는 화엄십찰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 점 등 고려전기 서울지역 및 중부지역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6월 중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9월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앞으로 현재 매몰되어 있는 발목 아랫부분을 발굴하고, 보호각을 새로 세울 예정이다.
또한 진관동 석 아미타불좌상은 상반신이 파손되었지만 아미타정인의 수인이 우리나라에서 극히 희소하고, 지금까지 알려진 아미타정인 불상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등 자료적 가치가 크므로 역시 6월 중 30일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9월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
진관동 석 보살입상과 석 아미타불좌상 및 석조 부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서울시 유형문화재는 총 280건, 문화재자료는 총 49건(2010.6월 현재)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문화국
문화재과장 안건기
2171-2580